![[칼럼] MERZBOW ── 소음, 해방적인 음향학](/../assets/images/column-merzbow.webp)
프롤로그: 침묵의 반전으로서의 소음
글 : mmr │ 주제 : 아키타 마사미/메르츠보우가 개척한 노이즈 뮤직의 철학과 문화사적 의의를 탐구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시작된 ‘노이즈 음악’은 월드뮤직사에서 독특한 궤적을 따라왔다. 그 중심에 계속해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아키타 마사미(메르츠보우)입니다. 그의 사운드는 폭력적이면서도 명상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유기적이다. 그것은 ‘음악’의 틀을 넘어서 ``청각 철학적 실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메르츠보우(Merzbow)라는 이름은 슐츠(Schulz)의 다다(Dada)풍 콜라주 작품 ‘메르츠바우(Merzbau)’에서 따왔습니다. 즉, 기존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파편들을 재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그의 창작원리인 것이다. 아키타 씨는 40년 넘게 활동해 왔지만 그의 철학은 언제나 ‘경청의 정치’였습니다. 소음은 단순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사회 질서에서 배제된 소리에 대한 반격이다.
배경: 일본의 아방가르드 토양과 DIY 문화
1970년대 말, 도쿄의 언더그라운드는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유지와 타케미츠 토루의 현대음악의 맥락, 펑크/프리 재즈의 충동, 그리고 예술계의 현재적 관행이 교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키타는 미술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몸과 소리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초기 메르츠보우는 액션페인팅과 유사하게 라이브 노이즈를 통해 관객과 공간을 참여시키는 ‘액션아트’로 발전하였다. 또한 그의 표현을 뒷받침한 것은 카세트 문화(카세트 언더그라운드)였다. 홈 녹음 + 메일링 네트워크라는 DIY 정신은 나중에 인터넷과 같은 현상이 될 현상의 전조였습니다.
미학: 소음 = 철거의 즐거움
메르츠보우의 미학은 ‘파괴가 아닌 재생’에 있다. 그의 소음은 모든 장르와 구조, 조화와 감정을 깨뜨리지만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소리 입자의 무한한 접힘은 청취자의 청각을 새로운 감각의 지평으로 끌어올립니다.
“소음은 자유의 소리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아키타 마사미 (인터뷰, 1994)
Merzbow의 창작 과정은 종종 생태계의 구조에 비유됩니다. 아날로그 노이즈(피드백, 테이프 루프, 미친 듯이 움직이는 효과)와 디지털 이후의 글리치 정밀도는 생물학적 돌연변이처럼 얽혀 있습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에는 ‘공명’이 존재합니다.
장비 및 제작 과정: 음향 “생태계”
초기에는 금속 쓰레기, 앰프, 마이크, 자기 테이프, 이펙터 등에 직접 연결되는 ‘물리적 노이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Mac과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면서 사운드의 세분성과 제어 가능성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키타는 통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붕괴 지점’을 찾기 위한 실험으로 전환한다.
그의 스튜디오는 수많은 아날로그 장치와 패치 케이블이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메르츠보우의 ‘소리’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 간섭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사회적 맥락: 동물 복지와 반자본주의
2000년대부터 아키타는 동물 권리 운동과 완전 채식주의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의 음악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작 ‘동물해방’과 ‘에코이드’ 시리즈에서 그는 소음을 인간중심주의 비판으로 재정의했다. 즉,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태저항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Merzbow의 음악은 또한 자본주의 상품 형태와 정반대입니다. ‘팔리는 음악’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페스티벌과 박물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역설이 탄생했다.
국제적 영향력: 소음을 글로벌 언어로 만들기
1990년대부터 Merzbow는 전 세계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를 통해 신화화되었습니다. Wolf Eyes(미국), Pruient(미국), Alva Noto(독일) 등 많은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일본의 소음’은 동양의 평온함과 폭력의 공존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서구 평론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노이즈씬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미 등으로 확산됐다. 그 근저에는 ‘누구나 소리로 세상을 해체할 수 있다’는 메르츠바우의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AI 이후의 소음
2020년대에는 AI를 통한 음악 생성이 일반화되면서 머즈바우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소음은 ‘인간 의식의 비알고리즘적 혼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성음악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워질수록 메르츠보우의 ‘혼돈’은 현실의 흔적으로 우뚝 서게 된다.
AI 소음으로 재현할 수 없는 ‘의식의 왜곡’은 그의 소리가 발산하는 인간의 현실이다. 이는 21세기 ‘몸 없는 음악’에 대한 최후의 거침없는 행동이다.
결론: 소음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Merzbow의 사운드는 더 이상 장르가 아닙니다. 이는 ‘살아남기 = 듣기’라는 기본 충동의 연장선이다. 그는 침묵마저도 소음에 담아 소리의 극치에서 존재 자체의 진동을 기록했다.
“소음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생명의 목소리다.”
연대기: Merzbow의 궤적
노이즈 발생 구조도
일본 아방가르드 음악사에서의 위치
노이즈음악의 진화과정
추천디스크
메르츠보우(Merzbow) – 메르츠버드(Merzbird)
Merzbow의 “Merzbird”는 2004년 미국 레이블인 important Records에서 발매되었습니다.
트랙리스트
1. Black Swan
2. Mandarin Duck
3. Emu
4. Victoria Crowned Pigeon
5. White Peafowl
6. Brown Pelican
유튜브
참고자료/자료
“소음은 음악의 무덤이 아니라 음악의 재탄생이다.”

![[칼럼] 제니 게바(Zeni Geva) – 일본 실험적 노이즈 록의 정점으로 30년의 역사](/../assets/images/column-zeni-geva.webp)

![[칼럼] 글리치: 노이즈가 아름다움으로 변할 때](/../assets/images/column-glitch.webp)
![[칼럼] 벤 프로스트와 음향건축: 소음과 구조 사이](/../assets/images/column-ben-frost.webp)
![[칼럼] 소음사막: 2000년대 텍사스 현장부터 현재까지](/../assets/images/column-texas-noise.webp)
![[칼럼] 베이 지역 소음/실험음악 현장 - 파괴와 공명 50년](/../assets/images/column-bay-area-san-francisco-nose.webp)
![[칼럼] 하이 브랜드와 노이즈 음악, 럭셔리함과 급진적인 어쿠스틱의 교차점](/../assets/images/column-high-brands-noise-music.webp)
![[칼럼]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 지하암반과 소음의 궤적](/../assets/images/column-japanese-underground-rock-noise.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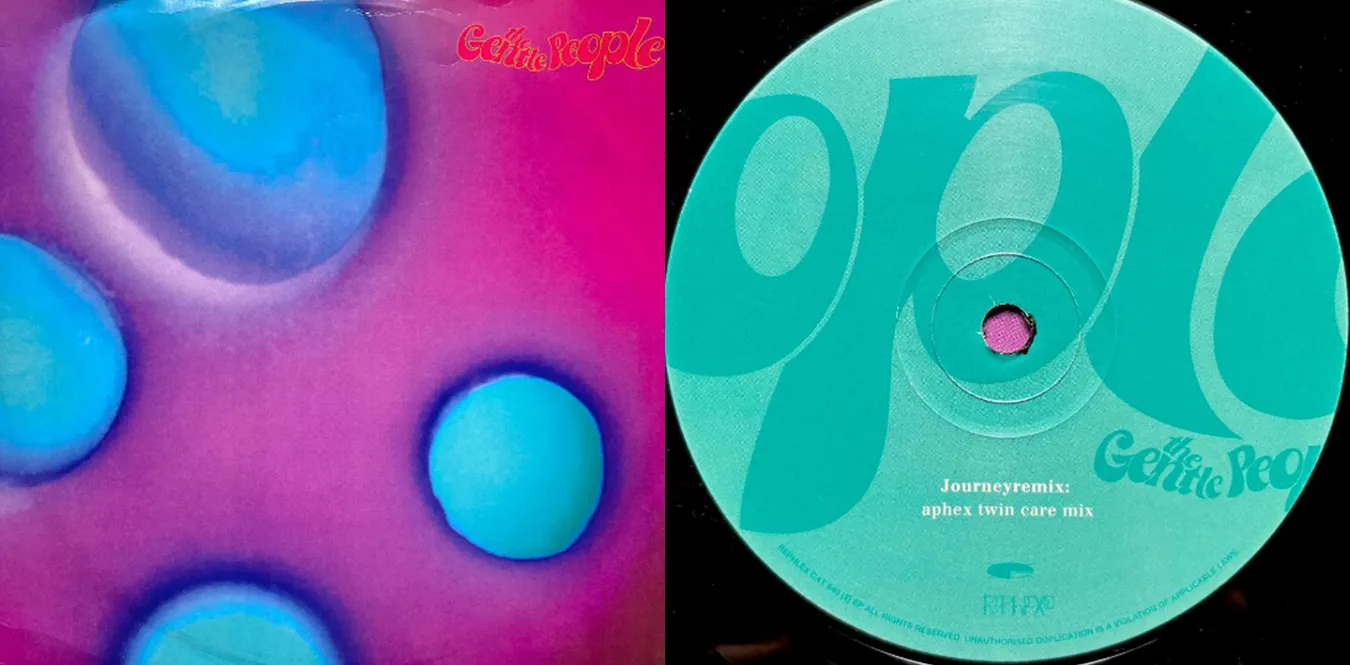
![[칼럼] 실험음악의 역사와 명작: 기원부터 현재까지](/../assets/images/column-experimental-music.webp)

